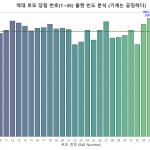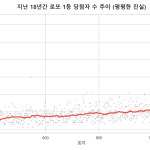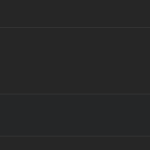얇아지는 책, 변해가는 출판 시장 (POD의 시대)
요새는 이런 책이 많은 것 같다. 아주 얇은 자가출판 서적들. 출판 시장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고, 팔릴만한 스타 작가 섭외도 어렵다 보니 출판사들이 마케팅비를 비싸게 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출판 산업 자체가 ‘린(LEAN)’하게 가는 것 같다. 누구나 책을 낼 수 있는 자비출판 형식으로 말이다.
엄밀히 말하면 자비출판의 개념도 좀 바뀌었다. 옛날에는 저자가 출판사에 몇백만 원을 내면 책을 수백 권 찍어주고, 저자가 그걸 알아서 처분해야 했다. (물론 출판사도 팔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무명 작가의 책이 잘 팔릴 리 없으니 재고가 되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바로 POD(Publish On Demand), 즉 ‘주문형 출판’이다. 교보문고 사이트에 가보면 POD 형식으로 발주되는 책들이 있다. 출판사는 플랫폼만 제공하고, 개인들은 여기서 인쇄기를 빌리는 셈이다. 개인이 원고 파일을 올리면, 독자가 주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인쇄가 시작된다. 재고 부담이 ‘0’인 것이다.
요즘 1만 원 미만의 책을 검색해 보면 거의 다 이런 POD 책이다. 챗GPT의 발달로 책 쓰는 게 쉬워졌으니 이런 출판 형태는 더 흔해질 것이다. 아마도 크몽 등에서 유행했던 전자책의 ‘종이책 버전’이 아닐까 싶다.
1만 5천 원짜리 책의 첫인상: “교정은 본 거야?”
서론이 길었다. 이 책 <평범한 나의 학원 운영 이야기> 리뷰를 시작해 보자. 이 책은 얇은 두께에도 불구하고 정가가 1만 5천 원이나 한다. 개인의 경험이라는, 어디 가서 쉽게 들을 수 없는 학원 운영 노하우를 담았기 때문일까? 그렇다 쳐도 책이 너무 얇아서 솔직히 실망했다.
책을 읽다 보니 “이거 편집자가 교정을 본 책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보통 책이라면 문단의 호흡이 있어야 하는데, 이 책은 첫 페이지부터 단락이 한 줄, 두 줄, 세 줄… 뚝뚝 끊긴다. 에세이 느낌의 줄글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엔터를 쳐서 문장을 짧게 만든 느낌이다. 읽기는 편할지 몰라도 문장의 맛은 없다. 아무리 봐도 전문 출판사가 교정을 꼼꼼히 본 건 아닌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내용은? 사교육 시장의 ‘민낯’이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포장의 문제일 뿐. 이 책은 문학 작품이 아니라 노하우를 배우기 위한 ‘실용서’다. 그런 면에서 내용은 굉장히 신선했다.
국내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몇 조 단위인지 가늠조차 안 된다. 가장 암흑 속에 있는 지하경제에 가까우면서도, 아무도 무 자르듯 정리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영역이다. 나는 사교육 시장을 잘 모른다.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까진 교습소, 학원, 공부방의 차이도 몰랐다. 그냥 다 학원인 줄 알았다. 하지만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이 책을 읽고 나니 비로소 동네 상가의 “수학 교습소” 간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학원 원장은 ‘선생님’이 아니라 ‘사업가’다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은 이것이다. “학원 원장과 학원 강사의 영역(역량)은 아예 다르다.”
뛰어난 강사는 학생들을 잘 이해시키고 성적을 잘 올리는 사람이다. 하지만 원장은 다르다. 저자는 경력단절 상태였다가 2010년경 교습소를 시작했다.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시기와 비슷하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구는 이렇게 성공해서 책을 쓰고 일가를 이뤘다는 사실에 잠시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왔다.
저자가 그 기간 쏟은 노력을 보면 ‘단기 집중’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다. 처음 궤도에 올릴 때까지는 미친 듯이 바짝 노력해야 단계를 넘어서는 성취를 얻을 수 있다. 노력에 비례하는 보상이 따르는 일, 그것이 사업의 특성이었다.
정글 같은 학원 생태계, 그리고 권리금의 세계
저자가 묘사한 학원업계는 그야말로 정글이었다. 학원이 좀 잘된다 싶으면 동종 업계 사람들이 구청, 교육청, 경찰서에 고소·고발과 민원을 넣어 방해한다. 단순히 애들만 잘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공격을 방어하고 처리하는 게 원장의 진짜 역량이라니.
더 충격적인 건 ‘학원 매매와 승계’에 관한 스킬이었다. 학원에도 권리금이 있는데, ‘권리 중도금’과 ‘권리 잔금’이 따로 있단다. 생전 처음 듣는 개념이었다. 상가 입지를 분석하고 들어가는 전략부터 권리금 협상까지… 학원 원장은 교육자라기보다 철저한 ‘경영자’여야 했다. 제도권 회사 밖의 진짜 시장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다.
프랜차이즈에도 ‘지역색(나와바리)’이 있다
또 하나 흥미로웠던 점은 학원 프랜차이즈의 지역성이다. 저자가 세운 프랜차이즈는 공략하는 지역이 명확했다. 서울 핵심 학군지가 아니라, 수도권 외곽 신도시 느낌의 학군지, 특히 서남부와 중남부에 집중되어 있었다. 식품 프랜차이즈가 본점 기반으로 특정 지역에서 흥하듯이, 학원 브랜드도 전국구로 무작위로 퍼지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퍼져나간다는 점이 신기했다.
결론: ‘평범’하지 않은 괴물의 이야기
책을 덮은 소감은 “저자가 할 말을 다 안 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빙산의 일각이다. 학원을 이렇게까지 키워오는 데는 책에 쓰지 않은 수많은 암묵지(교육 철학, 투명한 운영 시스템, 가맹점주 교육 등)가 있었을 것이다. 책이 너무 겉핥기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자의 내공은 깊어 보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충격은 에필로그였다. 저자는 학원 일에 미쳐 자녀들을 밀착 케어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고백한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스펙이… 국제고, 스위스 명문대, 미국 FIT(파슨스만큼 유명한 패션 명문대) 진학.
너무 어이가 없었다. 자녀들이 이런 미친 성과를 내다니. 결국 유전자가 달랐던 걸까? 저자의 명석한 두뇌와 노력하는 유전자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진 게 아닐까? 자식 농사는 하나만 성공해도 대박이라는데, 사업도 자식도 다 성공했다.
제목은 ‘평범한’ 이야기지만, 내용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슈퍼우먼의 이야기였다.